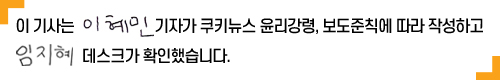‘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으로 불리던 한국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력난과 가동률 하락에 직면한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과 협력에 나서면서, 실증 단계에 머물던 국내 자율주행이 상용화를 전제로 한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일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A2Z, 휴맥스모빌리티 등과 ‘법인택시 면허 기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플랫폼과 관제 시스템 구축, 차량 관리 및 사고 조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 모델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택시 운영에 필요한 요금 체계와 관제 방식, 사고 대응 구조 등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를 기존 택시 면허 체계 안에서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사 구인난에 멈춘 택시, 구조적 위기가 협력 이끌어…주요국은 이미 상용화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전환 논의에 나선 배경에는 구조적인 인력난이 있다. 서울 기준 법인택시 가동률은 지난 2019년 50.4%에서 2024년 34.1%로 하락했다. 택시 10대 중 7대가 기사를 구하지 못해 차고지에 방치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운송 방식만으로는 가동률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택시 면허와 차고지·정비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외국 기업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됐다. 박복규 택시연합회 회장은 “자율주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내 환경에 맞는 단계적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구글 웨이모는 누적 실증 거리 1억6000만km를 돌파하며 미국 전역과 영국, 일본으로 영토를 확장 중이다. 중국 바이두 역시 누적 1억km를 넘어서며 독일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누적 주행거리는 1300만km 수준에 그친다. 무인 자율주행(레벨4) 실증 허가를 받은 기업도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한 곳뿐이다.
차두원 퓨처링크 대표는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46회 미래국토포럼’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로 레벨4 차량 3100여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연구용을 포함해도 132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은 있는데 제도가 없다…‘실증-상용화’ 단절
전문가들은 한국 자율주행의 한계로 기술이 아닌 제도와 구조를 꼽는다. 실증은 허용되지만,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승인 기준과 사고 책임, 보험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화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자회사 모셔널은 2020년부터 약 5조원을 투자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용화를 준비 중이지만, 국내 진출은 ‘검토 단계’에 머무는 이유 또한 이 같은 제도적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술은 국내에서 검증하지만, 실제 서비스 경험과 매출은 해외에서 쌓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황성호 성균관대 교수는 “실증이 끝난 기술이 상용 승인으로 이어져야 기업이 매출을 내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현재는 그 연결 고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도 상용화에 실패한 해외 사례 역시 경계 대상이다. 독일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을 법으로 허용했지만, 안전 검증에 집중한 나머지 실제 데이터를 쌓을 기회를 놓쳐 시민이 이용할 서비스는 거의 없다.
일본도 2027년까지 전국 100곳 이상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현재 수익 부재로 운행 차량은 11대뿐이다. 보조금을 100%에서 80%로 줄이자 지자체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차 대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이 멈추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제도 정비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실증사업도 시작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민간 협력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로 이어져 법·제도 정비와 발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협약은 실증에 머물던 국내 자율주행이 ‘사업 가능성’을 전제로 한 단계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