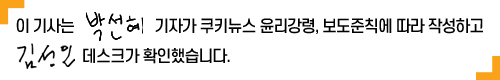“모든 직종이 생계에 영향을 받으면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내잖아요. 누구나 직업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만둘 수 있어요. 실상 우리도 월급 받는 회사원과 다를 바 없는데 말이죠. 왜 의사는 자신의 소신에 대해 협박을 받고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돼야 하죠? 의사는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도 존중 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기자가 만난 3년차 전공의 A씨)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열흘째입니다. 초유의 집단행동에 여론은 더 이상 이들의 편이 아닙니다. ‘환자를 인질 삼아 파업하는 자들’ ‘돈 밖에 모르는 전공의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사들’ 등 차갑게 돌아선 대중들은 저마다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29일까지만 근무지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이토록 비난을 받는 배경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BC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기록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의사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기 전, 본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맹세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2024년, 일부 대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서약은 졸업 전 치러지는 형식적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서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업적 윤리와 그 본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흐름은 사회적 변화와 삶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칩니다.
현 시대는 개인의 인권이 강화되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름지기 의사라면 수술용 칼을 들어야 하고, 환자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어 갑니다.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원급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거나 개원해 일반의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강제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공의들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2년 전 전문의가 된 B씨는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확실히 느꼈다고 말합니다. B씨는 “젊은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말하는 사명감과 희생만이 답이 아니란 걸 선례를 통해 배웠어요. 젊은 의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해요. 일방적인 지시는 통하지 않아요. 그만두면 그만인 거죠”라고 털어놨습니다.
정부는 시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의료계 선배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MZ세대인 전공의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몽둥이를 들어선 안 된다. 국민들도 어린 딸과 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강조합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단체도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필수의료과 2년차 전공의 C씨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정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정말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C씨는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로서도, 한 직종의 노동자로서도 존중 받지 못 했다고 토로합니다.
그래도 소통의 기회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단체는 ‘통보가 아닌 대화로 풀 수 있다면 언제든 현장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전공의들도 환자와 함께한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