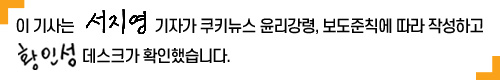“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탈락되는 게 맞나요?”
“청년 정책 지원하기 전 나이부터 확인해야 해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34세까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인구 감소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과 형평성 논란이 충돌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강원 삼척시에 사는 49세 A씨는 하루아침에 중년에서 청년이 됐다. 삼척시가 청년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삼척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달 경남 김해시는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지난 4월 강원 춘천시 역시 45세로 상향하는 등 ‘40대 청년’ 등장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 이하인 곳은 9곳에 불과했다. 39세 이하는 130곳, 45세 이하는 47곳, 49세 이하는 40곳이었다. 상한이 40세 이상인 곳만도 87곳에 달하는 셈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45세를 상한으로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곳이 39세를 상한으로 정했다.
청년 정책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다만 조례와 다른 법령으로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지자체별로, 또 고용·창업·농업 등 분야별로 청년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청년 연령이 계속 상향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자체들은 정책 대상인 ‘청년’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청년 연령 기준이 다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가 유일하게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가 아닌 45세로 두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다른 24개 자치구와는 다르게 정의한 것이다.
결국 도봉구에 인접한 강북구나 노원구에 사는 어떤 동갑내기는 청년 혜택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구에서 규정한 청년이라면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응시료 지원 등 여러 청년 정책을 누릴 수 있다”며 “청년 범위가 넓은 만큼 41세가 넘은 분들도 오셔서 관련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 차원의 지침을 요구했다. 해당 보고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청년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연령 상한 기준을 마련해 정책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나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서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 몇 개월 차이로 지원에서 탈락하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나이라는 행정 편의적 기준을 넘어 청년 개개인 상황에 초점을 둔 맞춤형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