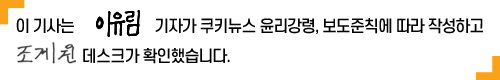건설현장에 젊은 노동력이 이탈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문가는 건설 교육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103만5724명 중 60대 이상은 27만7432(26.8%)명으로 40대(25만8143명·24.9%)보다 많았다. 60대 이상 건설기술인 수가 40대를 앞지른 것은 연구원이 연령별 현황을 분석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처음이다.
건설현장에서 젊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떠난 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빠르게 메꾸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전체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은 2020년 11.8%였으나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 2024년 14.7%로 매년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만1307명(83.7%)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인 2915명(5.9%) △베트남 1098명(2.2%) 순이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현장에서 언어 장벽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하늘에서 자재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비켜’라고 한국어로 외친다 해도 언어가 안 통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며 “현장에 외국인이 정말 많다. 국적도 다양해 근로자끼리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사고‧사망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해 건수는 8434건이었으며 이 중 39.8%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3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50대 근로자가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달 4일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현장 곳곳에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기한 안전 문구가 게시돼 있으며 작업 지시 등에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함께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외국인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번역이 어려운 건설 전문 용어를 담은 외국어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다국어 안전보건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기도 한다.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건설현장에 가보면 반장도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외국인이 많다 보니 업무 지시를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을 채용할 때 일정 수준의 건설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능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신규 내국인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