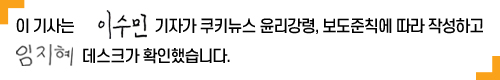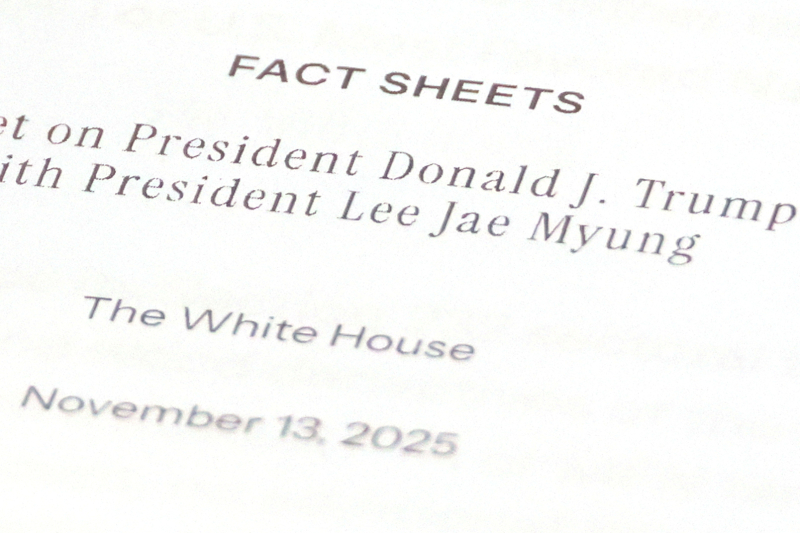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를 공개하면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 논의가 본격 재점화됐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문서화가 상징을 넘어 실건조·연료체계로 이어지려면 향후 원자력 협정 개정과 법적·정치적 승인, 산업 협력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팩트시트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평화적 이용’과 ‘미국 법령 준수’를 전제로 한 현행 체제 내 절차적 지원을 시사하지만, 군사용 추진체계와 직접 연동되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닌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건조 장소 최종 합의 방향’과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권한의 구체적 인정’을 변수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건조 장소 합의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 전제로 진행됐다”며 “건조 위치는 (국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 언급을 했던 바에 비춰볼 때 실제 최종 설계는 후속 협의 함수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은밀성을 바탕으로 타격능력을 지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전략 무기”라며 “한국이 국내 건조를 주장할 경우 미국은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 조선업 복원을 가장 우선시하는 만큼 협상 수단으로서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떤 지렛대로 작용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미국 내 특정 조선소의 설비·인력 노후화와 국내 건조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건조 장소 논의의 현실적 측면을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선 가장 최근에 지어졌다고 하는 필리조선소만 해도 상당히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다”라며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미-후한’ 절충 가능성이 거론된다. 초기 물량 일부를 미국에서 처리하고, 후속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양국의 정치·산업적 실익을 절충하는 시나리오다. 이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과 한국의 공급망 이익을 병행할 수 있는 안으로서 검토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원자력 법·협정 측면의 과제도 존재한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123협정)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며, ‘미국이 제공한 물질·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Any military use prohibited)’이 적용된다. 핵잠 추진용 연료·기술을 활용하려면 협정 개정 또는 별도 군사원자력 협정 같은 새로운 법적 틀과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주현 단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협정에는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기술은 군사적 용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 상태에서 미제 핵물질을 잠수함에 사용하면 협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다. 1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호주의 AUKUS 사례처럼 미국 원자력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경로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 123협정을 개정하거나, 호주가 오커스(AUKUS)를 통해 체결한 것처럼 별도의 군사용 원자력 협정을 새로 맺어야 한다, 의회 심사 등 이중 문턱이 존재해 속도전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