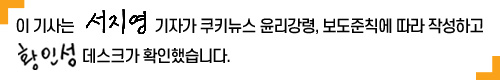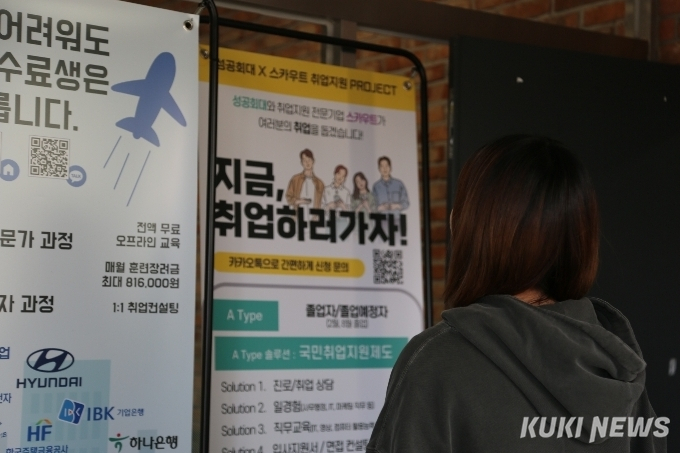
지속되는 취업난 속에서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인턴, 자격증, ‘중고신입’ 경력 등 더 많은 경험(고스펙)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신입사원으로 받아들이는 나이 상한선은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청년들은 되레 ‘나이 딜레마’에 빠져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이같은 ‘이중 잣대’는 HR테크기업 인크루트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신입사원의 ‘평균 적정 나이’는 남성 30.4세, 여성 28.2세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스펙을 쌓고 경력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과 구직자 모두 “신입이라면 이 정도 나이는 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입사 가능한 최대 나이’는 되레 낮아졌다. 인크루트 조사에서 남성 32세, 여성 29.6세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준비된 인재’를 원하면서도, 실제 채용에선 ‘조직 적응력’을 이유로 더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셈이다. 경험은 원하지만 나이는 배제하는 모순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극심한 압박을 호소한다. 대학생 유영주(23)씨는 “적어도 27살까지는 무조건 취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며 “나이 많은 사람도 뽑는다고 하지만, 보통 중고신입처럼 그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최씨(30)는 “경력이 있다 보니 나이에 대한 부담은 덜하지만, 만약 경력 없이 이 나이라면 채용 과정이 훨씬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고스펙’과 ‘어린 나이’를 동시에 요구받는 현실인 것이다.
기업들 역시 청년세대의 불안과는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실제 기업 관계자 A씨는 “요즘 대부분의 기업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며 “신입을 키우면 장기적으로 로열티가 높겠지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인력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의 근본적 배경으로 ‘경력직 중심 채용’이라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지목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이 과거처럼 다수를 선발하는 공채 방식 대신,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경험(스펙)을 쌓지 못한 청년일수록 취업 제약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법인세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해 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 A씨 역시 “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산업을 발굴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려면 정부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청년들은 ‘스펙을 쌓느라 시간을 보내면 나이 제한에 걸리고, 나이에 맞춰 서두르면 스펙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놓인다. 이 교수는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자신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이’가 합격의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도 여전하다. 최근 취업에 성공한 30대 공씨는 “3년 전 면접에서도 ‘나이가 있는데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이는 실력이 아닌 나이로 인한 조직 융화 문제를 걱정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나이 서열’이라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분제가 사라진 뒤에도 나이는 오랫동안 사회질서의 중심 축으로 기능해 왔다”며 “하지만 민주화 이후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공공부문 채용에서는 상당 부분 나이 제한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나이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기업들도 나이보다 실력과 역량을 우선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