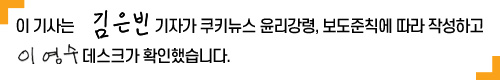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식품 안전 관리 전반에 걸쳐 전면 도입한다. 식중독 원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AI 원인추적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육 이물 검출률을 높이는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통해 식중독 원인조사와 축산물(식육) 이물 검출을 위해 AI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 활용해 식중독 원인 조사…의료비 절감 효과
현재 식중독 원인 조사는 ‘인력 중심’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국 약 300여명의 담당자가 발생 장소, 일시, 주요 증상, 잠복기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원인균과 원인식품을 추정하고 있다. 조사관의 전문성, 정보 분석 능력에 따라 원인 추정·조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신속·정확한 식중독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AI 식중독 원인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2027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현장 조사관이 입력한 정보에 해당 지역 기온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해 원인균과 원인식품을 신속하게 추정한다. AI가 위험도 높은 시료를 예측해주면, 조사관은 검사 우선순위에 따라 의심 식품의 유통을 즉각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을 막아 조기종식을 유도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비 손실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중독에 의한 의료비 손실비용은 연간 약 419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환자 수 5915명을 적용해 추산할 경우, 환자 1명을 줄이면 약 7100만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삿바늘 클레임 이제 그만”…AI가 식육 이물질 검출
식육 처리 과정의 안전성도 AI가 책임진다. 현재 이물을 골라내기 위해 육안, 금속검출기, X-ray기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삿바늘 등 위해성 이물질 검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한우를 먹다가 그 안에 있던 주삿바늘을 삼켰다는 사연에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주삿바늘이 나왔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실제 식육 관련 제품 소비자 이물 신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575건에 달했다. 검출된 주요 이물은 △플라스틱 385건 △벌레 360건 △금속 352건 △머리카락 308건 △곰팡이 246건 △화농 17건 등이 신고됐다. 이에 “고기에서 주삿바늘이 발견됐다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았다.
정부는 기존 검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육 AI 이물검출기’ 개발을 추진한다. X-Ray 또는 초분광 영상 등을 학습한 AI 엔진을 통해 이물 혼입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대비 검출률과 정확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육을 구매·섭취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물 클레임 감소로 인한 영업자의 손실 비용 및 부담 경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식품 안전관리 분야 등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식품 관련 축적 데이터,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통관단계 검사 및 현지실사 대상 업소 선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수입수산물 AI 관능검사 모델도 개발해 어류에 대한 선도, 색깔 등 이미지 분석을 통해 관능검사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