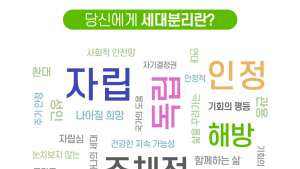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다. 부모 속 한 번을 썩이지 않은 착한 자식이었다. 힘든 공부를 하며 투정도 한 번 부린 적 없다.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지난 23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가 목을 매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후 언론에서는 ‘연구 스트레스’와 ‘학업 비관’을 사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의 주장은 다르다.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들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만난 A씨의 가족들은 모두 지쳐있었다. A씨 어머니의 메마른 입술과 힘없이 늘어진 팔다리가 그 상태를 증명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심신을 추스르기도 전에 그는 아들의 사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물리적 사인은 자살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이유는 따로 있다”며 “연구실 B 지도교수와 선후배들의 지속적인 과제 떠넘기기가 있던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2014년 9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유가족이 이야기하는 비극은 5~6개월 전 B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후부터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금까지 학업 스트레스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고등학교 때부터 A씨와 친구였던 한 카이스트 대학원 재학생은 A씨가 학업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먼 타입이었으며,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편이었다고 회상했다.
A씨의 어머니는 “B 교수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8㎏이 증가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에게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연구실 선배 C씨와 D씨가 다른 후배 E씨와 함께해야 할 연구를 아들에게 부탁했다. 자기 분야도 아니었다.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후배 E씨가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아들이 그를 대신해 선배들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옥상에서 연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일인지 현재 카이스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에게 물어봤다.
한 학생은 “연구와 실험이 주된 임무인 대학원생이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실험을 못 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그것도 후배 일을 선배가 대신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재학생은 “연구실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엄격한 연구실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유로운 분위기의 연구실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경우, 같이 고생하는 동료이기 때문이 서로 도와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안의가 추정한 A씨의 사망시간은 오후 1시다. 그러나 유가족이 복구한 그의 컴퓨터에는 오후 2시30분까지 검색기록이 발견됐다. ‘매듭 묶는 법’과 ‘목동맥’ 등을 찾아본 것이다. 무엇이 그를 사지로 몰고 간 것일까.
A씨는 사망하기 전 B 교수 연구실 비서에게 두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전 10시32분에 18초간, 이어 11시37분에 36초간 통화를 했다. 사고 당일 전화를 건 이유를 묻는 유가족에게 학교 측은 “비서가 전화 한 게 아니라 연구실 동료들이 A씨가 안 오니까 전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곧 이야기는 달라졌다. B 교수는 다음 날 유가족을 찾아와 “첫 번째 통화는 비서가 조교업무를 맡은 A씨에게 일반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전화였으며, 두 번째 전화는 A씨가 전날 연구실에서 온도계를 써서 온도계 위치를 확인하려 전화했다”고 이야기했다.
답변은 또 달라졌다. 이번에는 B교수의 비서가 “A씨에게 과제를 맡겼는데 다 했는지 확인 차 전화했다”며 “두 번 전화를 걸었지만, 한번은 통화가 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이 “두 번 다 통화를 받은 기록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B 교수의 비서가 A씨에게 맡긴 과제도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원래 연구실장 F씨의 일이었으나 그가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A씨가 과제를 맡았다”고 토로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해야 했던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교로서 후배들의 시험지를 채점해야 했으며, B 교수가 두 개의 세미나 준비를 맡겼고, 오는 8월 미국으로 떠나는 본인의 세미나 준비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의문만 더해가는 학교의 행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 23일로 돌아가 보자. 오후 6시30분쯤 연구실 동료들이 숨진 A씨를 발견한 후 6시58분에 학교 측은 처음으로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통화내용이 비상식적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학생지원팀장은 A씨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 학부모가 맞느냐’ ‘최근에 아들과 통화를 했느냐’ ‘아들 소식을 들었느냐’를 묻고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끊었다.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유가족은 바로 대전으로 갈 채비를 하며 A씨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이후 사고 현장에서 전화를 받은 경찰에게 A씨의 사망 사실을 듣게 됐다. 학교 측은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꾸려진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학교를 찾은 유가족에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아들을 명예를 위해 (사고를) 묻고 가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가슴을 쳤다.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다. 언론보도를 담당하는 홍보실은 학생지원팀으로, 학생지원팀은 사고조사위원회로 전화를 넘겼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앞으로 며칠간 위원장이 외근을 나간다”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따로 해줄 말이 없다”고 대응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유가족에게 밝힌 조사 시작일은 오는 13일이다.
사고 수사를 맡은 대전 둔산경찰서는 “다각적 방면으로 수사하고 있으나 유가족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경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형법에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교사를 하거나 방조를 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 살인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살 행위가 타인의 의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교살 방조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사진=박효상 기자 islandcity@kukimedia.co.kr
[쿠키영상] “내가 먹히는지 네가 먹히든지” 한판 뜬 결과는?
[쿠키영상] 김주혁 모친 발인, 아버지 故김무생 곁으로..."'장가가는 거 못 보고~’그런 말 하지 말자!"
[쿠키영상] "우주에서 토르티야 만드는 법!" 여성 우주비행사의 '특별한' 요리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