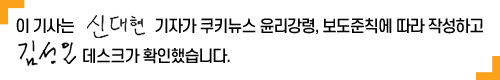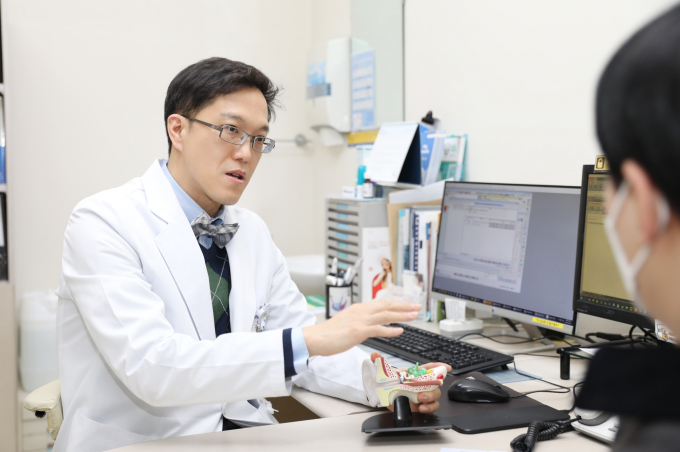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을 앓는 20대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초기 치료 여부에 따라 청력 회복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가 요구된다.
심대보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15일 “돌발성 난청은 응급치료 여부에 따라 정상 청력을 되찾기도 하지만 환자의 3분의 1은 난청이 전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젊은 층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돌발성 난청 환자 수는 8만4049명에서 2022년 10만3474명으로 약 23%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20대는 8240명에서 1만1557명으로 4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교수는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된 환경이나 이어폰 등을 통해 고음을 장시간 듣는 음악 청취 습관, 휴대폰 사용, 스트레스와 불안 같은 요인들이 20대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돌발성 난청은 이름처럼 어떠한 전조증상 없이 수 시간에서 2~3일 이내에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많은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며, 초기 치료 여부에 따라 청력 회복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응급질환으로 분류된다.
정상 청력을 0~20㏈(데시벨)라고 할 때,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 이상의 난청이 발생하면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한다. 돌발성 난청은 보통 한쪽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30~40㏈ 이상 청력이 떨어지면 일상 대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 정밀검사를 진행해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특발성’이라고 하는데, 돌발성 난청의 80~90%가 이 특발성에 해당한다. 다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나 혈관장애로 인한 달팽이관 저산소증, 외상, 면역성질환, 메니에르병, 종양성 질환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귀에 이명이 나타나거나 먹먹하게 느껴지는 것(이충만감)이다. 돌발성 난청은 3분의 2 정도가 이명을 동반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명이나 이충만감이 지속되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증상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만큼 일회성으로 잠시 증상이 나타난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나절 이상 지속되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 교수는 “일부 환자들은 어지럼 증상이 동반해 응급실을 찾기도 한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늦어도 14일 안에 치료받아야 하며, 3~7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 후에도 3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청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 시점에선 보조기기를 통한 청각재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청 정도가 약한 경우 스테로이드를 통한 약물치료만 진행된다. 하지만 난청이 심하다면 스테로이드와 고압산소치료가 병행된다. 돌발성 난청의 특별한 예방법은 없으나, 평소 귀의 피로도를 낮추는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고 심 교수는 말한다. 휴대용 음향기기를 이용할 땐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하루 60분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심 교수는 “술, 담배, 커피 등은 귀 신경을 자극하고 혈관 수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섭취를 삼가거나 줄여야 한다”며 “주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 자신의 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